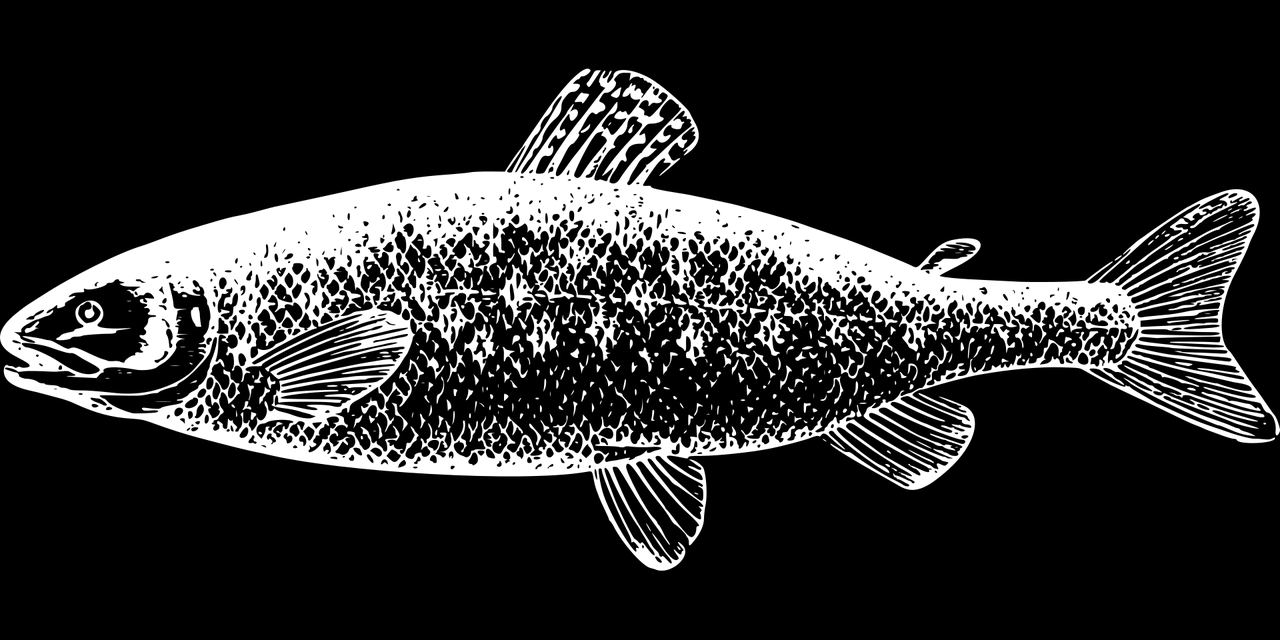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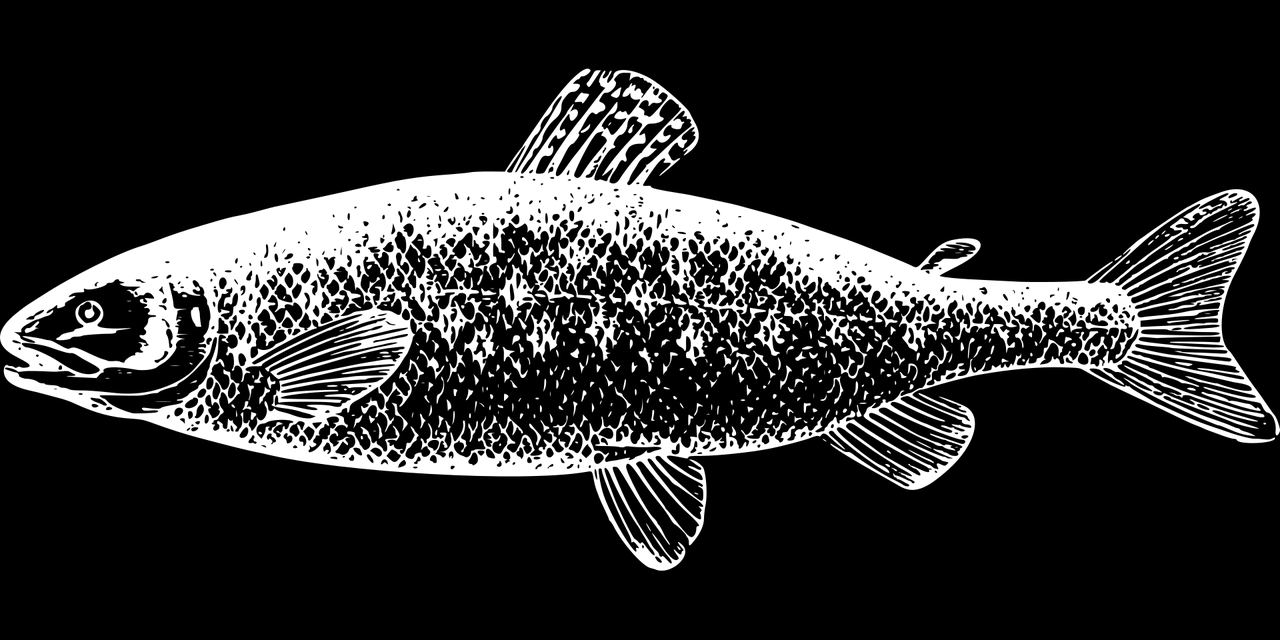
나는 회에 초장을 찍어먹지 않는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바다를 좋아하셨다. 집에는 해산물의 그림이 있고, 청색의 바다를 달리는 요트의 그림이 있으며, 나에게 말해주었던 것들도 바다 이야기였다. 나는 아버지의 바다를 모른다. 아버지가 바다를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는지, 바다의 어떤 점이 그리도 좋은 것인지, 하나도 묻지 못했다. 지금으로써는 단순히 낚시에 대한 애정이 바다가 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만 할 뿐이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셨다. 식탁에는 회가 곧잘 올라오고는 했다. 아버지는 회를 초장에 찍어먹지 않았고, 어머니도 그랬다. 나의 독특한 식성이 생긴 것은 이때부터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날 것의 맛' 이라고 했다. 단맛도 짠맛도 고소한 맛도 아닌 날 것의 맛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날것의 맛과, 그것을 즐기는 아버지의 식성이 유별났음을 알려 준 것은 맛집 탐방 프로그램의 우스꽝스러운 나레이션이였다.
어릴 적의 나는 생선이 좋았다. 그야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 바다 뿐이였으니까. 크레파스로 빈틈없이 도화지 위를 꽉꽉 채우라는 말을 들었을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등 푸른 생선을 타고 있는 우리 가족이였다. 말을 떼는 방법을 늦게나마 간신히 배워 겨우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할 때 쯤에, 문득 나는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물고기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시간을 비워 나를 바다로 데려가셨다. 바다는 아버지의 차로 한 두시간 정도를 달려야 볼 수 있는 것이였다. 차 뒷자석에 누워 잠을 자려다 말고 몸을 일으켜 창문을 내다본 기억이 난다. 정말, 정말 옛날이라 차 안에서의 기억은 단 한 순간의, 딱 한 순간 고정된 뿌연 이미지 하나 뿐이다. 창 밖에는 배 몇척 위로 날아다니는 갈매기, 바다와 사람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셨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엇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낯가림이 심했던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한 아저씨가 나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저씨는 볼까지 올라오는 회색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을 싣고 배가 출발한 지 몇 분 정도.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챙겨온 짐을 풀어 무언가 준비를 한다. 아버지도 낚싯대를 꺼내들어 무언가의 채비를 하고 계셨다.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뒷짐을 지고 제자리만 빙빙 돌고 있었다.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로 말이다.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 있냐고 한 소리 들을 정도였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다. 아버지는 나를 불러 품에 안은 채 낚싯대를 쥐어주셨다. 그제서야 가만히 있을 수 있었다. 낚싯대를 붙들고 가만히 있었다. 보통 나가떨어질 만도 할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어린애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다. 크레파스로 빡빡하게 그려낸 등 푸른 생선이 잊혀지질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감싸쥔 나의 손에서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났다. 아버지는 낚싯대를 직각으로 세우라고 했다. 아버지의 힘에 의지해 낚싯대를 직각으로 빳빳이 세웠다. 아버지는 다른 한 손으로 낚싯줄을 감아올렸다. 나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무언가가 바다 위로 올라왔다. 의심할 여지 없는 생선이였다. 고깃배는 높고, 낚싯대는 길어서, 서서히 다가오는 저 조그마한 것에 얼굴을 찡그리며 눈대중했다. 서서히 다가오는 생선. 쿵쾅거리는 심장. 그런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낚싯줄이 목에 걸린 채 마구 퍼덕거리는 생선의 모습. 그 광경은 견뎌내기에는 상당히 비릿한 것이였다.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의지해 간신히 올라오는 구토를 참아내고 있었다. 생선을 열심히 따라그리던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보는 진짜 생선의 모습에 겁을 먹어버리고 말았다. 물고기는 배에 쉽사리 내려앉지를 못했다. 아버지는 물고기에 걸린 낚싯줄과 한바탕 씨름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입가에 있어야 할 낚싯바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셨다. 나는 낚싯바늘이 그 꿈틀대는 것의 목에 걸려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곧바로 생선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눈에서 나오는 영혼까지 지니게 되었다. 생선은 눈을 헤깍 뒤집을 듯이 나에게 다가왔다. 머릿속의 스위치랄 것이 돌아가버린 것은 그때였다. 나는 그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뒤로하고 생선에게서 도망가버리고야 말았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다며, 칼을 꺼내들어 그것의 목을 잘라내버리고야 말았다. 그 광경을 도저히 볼 자신이 없었다. 나는 배의 안쪽으로 들어가 한껏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겁 먹은 나를 보고 한 숨을 크게 쉬시더니 웃옷을 벗어 나에게 둘러주었다. 그렇게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저씨와 함께 낚시를 했다. 아까 낚은 그 생선에 자꾸만 눈이 갔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사라져버린 물고기에게서는 어떠한 역겨움도 느낄 수 없었다. 쳐다보는 것조차 고역이였던 그 생선에게 다가갔다. 툭툭 쳐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었다. 심지어는 말도 걸어보았다.

회를 먹는 사람들은 말이 많았다. 나의 마음속은 굳어지기만 한다. 이 곳의 사물과 동화되어 음침하고 뒤틀린 생각만을 하게 된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사람이 될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이 일종의 죄처럼 느껴져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랬다.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 아저씨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 덥수룩한 수염과 구릿빛 피부. 광어회 한 조각을 집어 앞접시에 담긴 초장에 찍어먹었다. 아버지가 광어회를 유달리 좋아하셨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아저씨의 넥타이에 시선을 고정하고 말 없이 나는 횟 조각을 집는다. 광어. 광어. 흰색 조각. 분명 들어는 봤는데. 나의 젓가락에 집힌 흰색 조각만이 보였다. 도무지 광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릴 수 없었다. 마침내 회가 담겨 있던 접시에는 초장 방울과 흰 면발같은 것만이 남고, 횟 조각과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떨어졌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나에게 눈치를 주었다. 어째서인지 나의 차례가 왔다. 입을 떼었다. 나는 내가 회를 먹을 때 초장을 찍어 먹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설명조가 아닌 푸념을 늘어놓듯이.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어렸을 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의 한 두시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였다. 어쩌면 절대로 씻어낼 수 없는 것이기도 하겠지.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그 바다의 의미가, 나에게 도달해 무엇이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 되는지. 결국 나는 뜬 눈을 가진 산 물고기보다 죽은 물고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