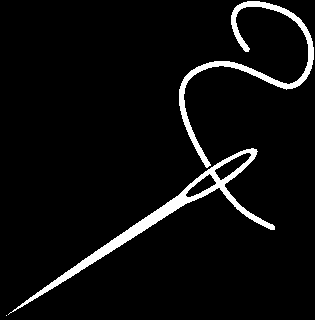
모임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인쇄한 뒤, 손수 코팅해서 열쇠고리 비슷한 것을 달고 오백원 비싸게는 천원에 팔고 있었다. 대부분은 만화 캐릭터였다. 몇몇은 이거 색이 왜 이렇게 붕 뜨게 나오냐고 불평했다. 학교의 저질 프린터를 쓰기보다는 업체에 맡겨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보통은 모니터의 RGB와 프린터의 CMYK에 관한 문제였지만 말이다. 몇몇은 만화 캐릭터처럼 분장을 하고 부스를 지키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대부분 관심이 없었고, 몇몇은 그게 웃기고 기괴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래 사진이나 찍으며 낄낄대기는 했다. 결국 크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차라리 어디 코믹월드에 따로 부스를 차리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미술실 모임은 학교 축제에 덩그러니 떨어진 외계인 집단이 되었다. 가장 반가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요즘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다고 말하며 뭘 사가는 누군가의 부모님들이였다.
축제의 막바지는 더럽게 재미가 없었다. 삼삼오오 모여 줄을 맞춰서 강당에 입장, 별 접점도 관심사도 같지 않은 반 친구들끼리, 게다가 번호 순으로 앉았다. 목소리 큰 학생회 친구들이 무언가를 준비했다. 인기가 많았던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밴드를 만들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급조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다. 당연히 끔찍했다. 작년에도 끔찍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끔찍했다. 나름 합이 맞았던 아이돌 안무를 추던 팀이 차라리 볼 만했다.
쉬어가는 시간이였다. 누가 나더러 따라오라고 했다. 나? 왜? 일단 와보라고 했다. 도대체 나를 부를 일이 뭐가 있을까. 뭘 잘못했나? 물어봤다. 아니, 이게 뭐에요? 저번에 포스트 잇에 뭐 적어 냈던거 기억 안나? 너 거기에 뽑혔어. 뭐요? 내가 뭘 적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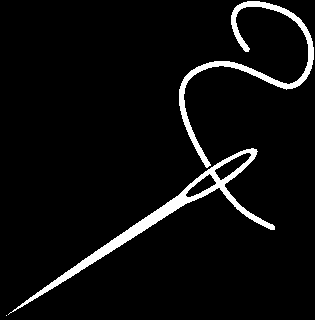
선배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여기저기 물었다. 우리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제서야 서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되었다. 생각 없이 적어낸 사연이 전교생에게 읽혀지고, 선배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전교의 학생들이 “오, 아, 우, 아아” 같은 감탄사와 박수를 쏟아냈다. 선배에게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려고 말을 걸었지만 선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선배와 나는 아무 말도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예쁜 조명이 켜졌다. 스포트라이트였다. 토가 나올 것 같았다.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더듬거리며 아무 말이나 했다. 사람들은 내 더듬거리는 말을 좋아했다. 내 키와 선배의 키 차이를 좋아했고, 내 외모를 좋아했고, 선배의 외모를 좋아했다. 내가 꾸며낸 안쓰러운 이야기를 좋아했다. 역한 감정에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지, 박수와 탄성과,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연호. 벌거벗겨진 느낌이였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지못해 선배를 안았고, 선배도 나를 안았다. 무슨 기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선배는 내 귀에 대고 무언가를 조곤조곤 말했다. 놀랍게도, 나는 그게 무슨 말이였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선생님들은 나의 용기를 높이 샀다. 이렇게 조용하고 말 수가 없는 네가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런 무대에 나왔을까, 대단하다고 말했다. 난 그 칭찬의 내용들만 기억한다. 아주 생생하게... 선배에 관한 거라곤 저 멀리 강당 뒤 화장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선배의 뒷모습 뿐이다.